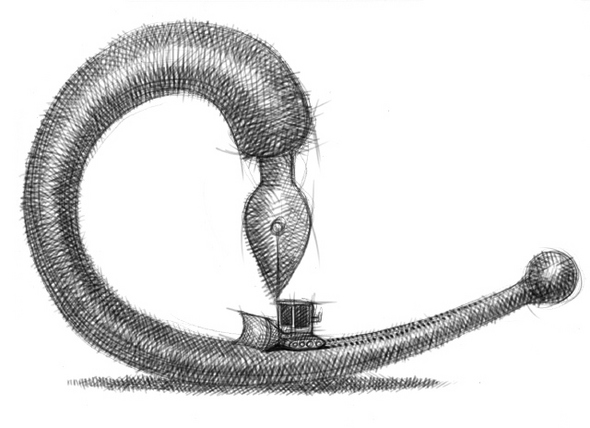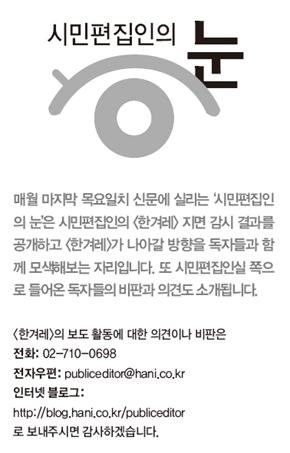본문 시작
언론보도
[한겨레] 진보언론이 바꿔야 할 경제사상의 물줄기
- 관리자
- 조회 : 4272
- 등록일 : 2008-12-26
1929년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하다는 불황이 닥치자 국가 개입주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그가 탁월한 경제학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편으로 대단한 저널리스트였다는 사실이다.
<경제 언론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 웨인 파슨스는 ‘케인스가 1920년대에 명성을 쌓기 시작한 것은 교수가 아니라 경제 저널리스트로서였다’고 썼다. 학술지보다는 언론매체가 그의 공론장이었다. 당시 그는 경제현실에 대한 조회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각종 신문과 잡지에 무려 300건의 기사를 썼다. 우리나라 상당수 사회과학도들이 ‘잡문은 안 쓴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현실의 끈을 놓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
||||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물결은 ‘시장의 대실패’를 겪고 나서야 기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는 1979년부터 누적된 신자유주의적 모순의 귀결점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정책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는데도 그 조류를 외면하는 지구상의 독보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신개발주의와 결합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반환점에서 돌지 않고, 가던 방향으로 계속 달리는 마라톤 선수라고나 할까?
한국사회의 방향감각 상실 증세는 지식인과 언론의 책임이 크다. 위기와 함께 반성의 기회가 왔는데도 다수 학자들과 보수언론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겨레>조차 균형을 잡는 일에서 기대에 못미쳤다.
최근 사례로 ‘4대강 정비계획’이 보도된 16일치 한겨레를 보자. 한겨레는 ‘대운하 추진단이 4대강 비밀추진팀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나, 해설은 1개면에 그쳤고, 그나마 지방판에서는 5면에 실렸다가 나중에 3면으로 앞당겨졌다. <경향신문>이 3면과 4면에 펼친 것이 돋보였다.